
“야 할머니다. 꼬부랑 할머니!”
떼구름처럼 모여든 아이들이 나를 구경한다
초롱초롱 빛나는 그 눈빛, 눈빛
저 아이들 눈에
나는 천사일까
괴물일까
허허로운 저녁 햇살이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간다
박정완 시 ‘천사들의 마당’ 중에서

늙어서 찡그리면 괴물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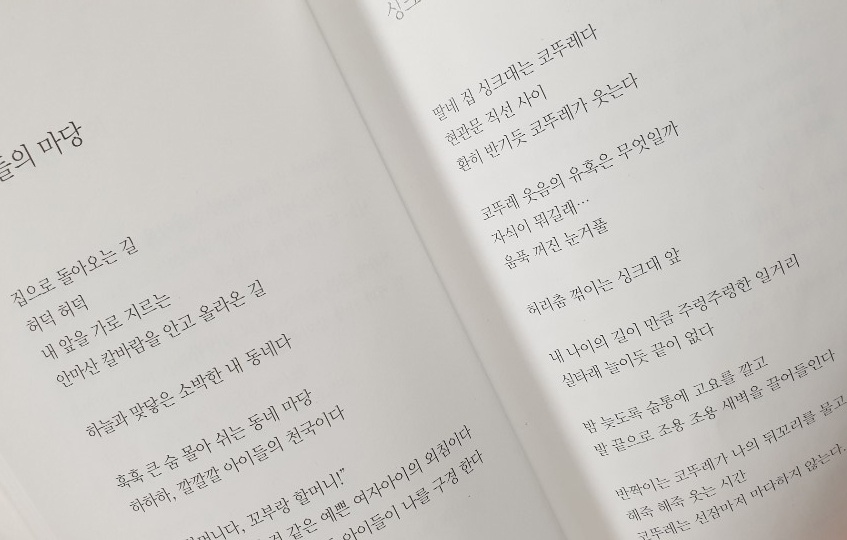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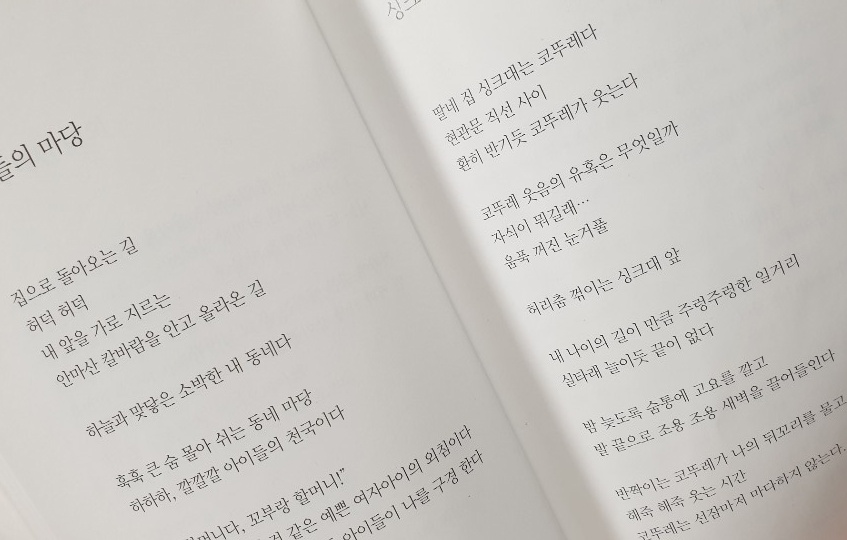
88세에 시인이 된 사람이 있다.
박정원. 89세. 전직 도청 공무원.
“내가 원래 마라토너였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됐지 뭐야?”
유쾌한 목소리, 장난기 가득한 얼굴.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다.
출장 중 교통사고로 척추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지금은 꼬부랑 할머니가 됐지만 젊은 시절 마라톤, 스키, 수영 등 안 해 본 운동이 없다고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길을 걷고 있으면 아이들이 달려와서 “야~ 꼬부랑 할머니다”라며 신기한 듯 쳐다본다고 한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이 천사지 뭐야. 근데 나도 천사가 될 수 있어. 항상 웃으면 돼. 늙어서 화내고 인상 찌푸려 봐. 그게 천사야? 괴물이지.”

배우고 또 배운다
“혼자 사시는 거 맞죠?”
“어. 독거노인. 사별한 지 25년 됐어.”
상대가 당황스러우리만치 대답마다 주저 없고 명쾌하다.
“독거노인이지 뭐.”
“아픈 데는 없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안 아픈 줄 알아. 맨날 웃고 있으니까. 몸이 아파도 뭔가에 몰두해 있으면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맨날 뭐든 배우러 다니는 거야.”
그녀는 몇 년 전 자식들에게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보내 달라고 말 한 적이 있다. 지병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이가 많아 운신이 힘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싫어서였다.
“그때 서울 사는 큰딸이 펄쩍펄쩍 뛰더라고. 그 길로 바로 평생학습관 바로 옆에 있는 주공 6차 아파트로 이사를 시키더라고. 내가 문화원에서 이것저것 배우는 재미로 사는 걸 알거든.”
이번에 평생학습관에 신청한 강좌 두 개가 모두 당첨됐다며 아이처럼 좋아한다.
“<쉽게 배우는 영어>랑 <건강 자가요법> 두 강좌가 모두 됐어. 얼른 가서 수강료를 냈지.”
‘꼬부랑 그녀’의 보석같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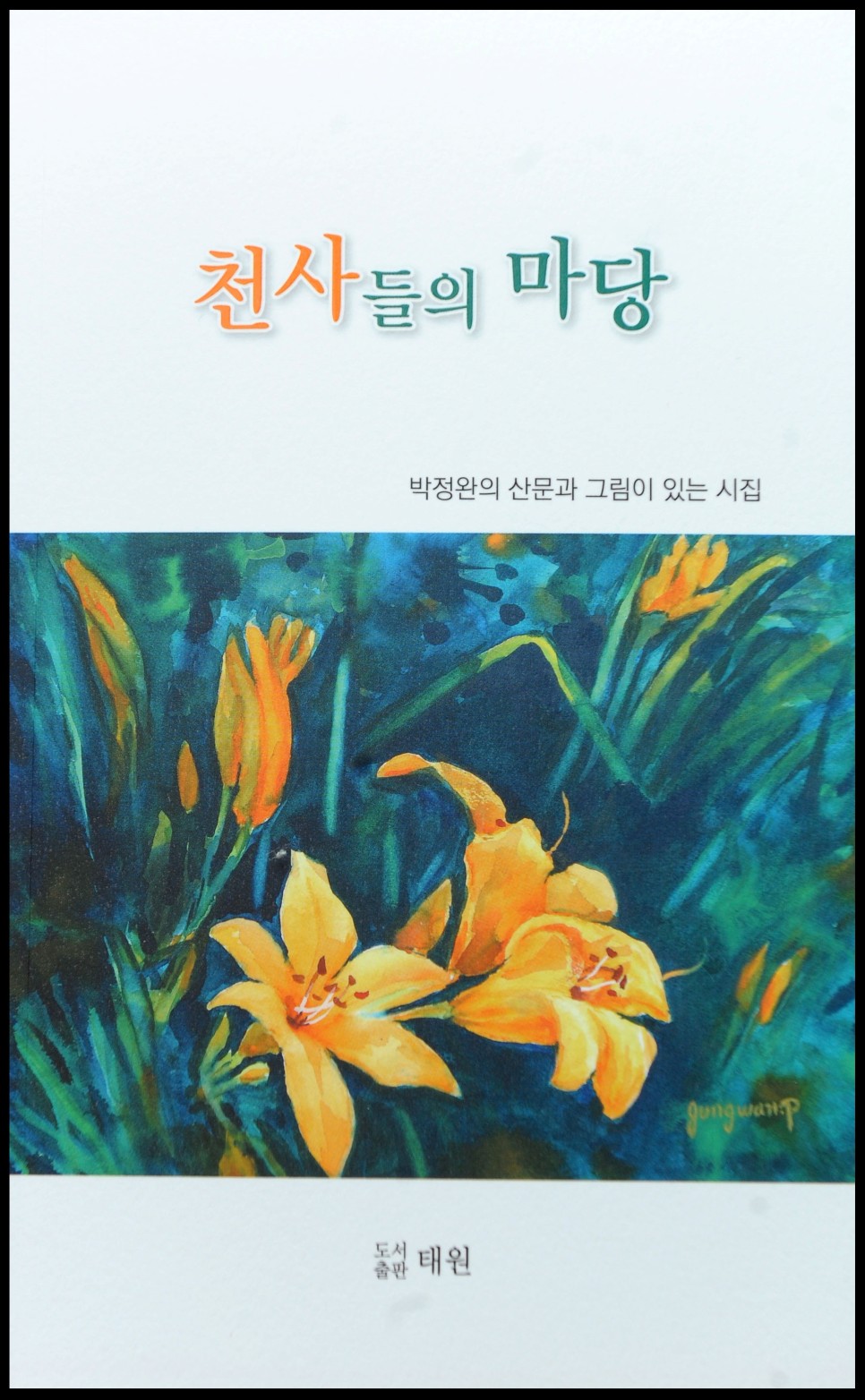
시는 왜 쓰는지, 쓰면 뭐가 좋은지 물어봤다.
“어느 날 강원일보 앞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어. 택시가 내 앞에 섰는데 저쪽에서 젊은 여자가 달려와서는 그 택시를 타고 가는 거야. 근데 그걸 뒤에서 오던 자가용 운전자가 봤나 봐. 차에서 젊은 남자가 내리더니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모셔다드릴게요. 그러는 거야.”
그녀는 그런 감동의 순간에 즉시 시가 나온다고 했다. 인터뷰 내내 ‘나는 한가한 사람’이라고 말하던 그녀. 택시를 가로챈 젊은 여자에 대해서도 전혀 분노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한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젊으니까 바빠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단다.
그녀가 말하는 한가함은 외로움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여유로움, 포용, 배려 이런 단어들과 어울렸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잠들기 전에도 그 옛날 고마웠던 사람들을 항상 떠올려. 지금까지 무탈하게 사는 게 다 예전에 함께했던 사람들 덕 아니겠어. 나는 세상이 너무 감사해.”
그런 감사함 덕분에 퇴직한 그 다음 날로부터 바로 자원봉사를 시작했던 그녀다. 지적장애인 시설인 밀알재활원에서 행정 봉사를 했다. 그들이야말로 천사라며 그때를 돌아보면 참 보람 있었다고 말한다.
배우고 봉사하고 시 쓰는 일 외에 그녀가 좋아하는 일이 하나 더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과 노는 것. 손주들은 그녀를 ‘까불이 할머니’라 부른다. 손주들이 올 때마다 일부러 화려한 옷을 입고 개구쟁이 친구처럼 놀아주기 때문이다.
그녀가 늘 웃자고 하는 이야기. ‘너무 겸손해서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 ‘나이를 잊은 까불이 할머니’.
인터뷰를 마치고 ‘꼬부랑 그녀’와 같이 길을 걸었다. 그녀의 보폭을 맞추기 위해 천천히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야 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다. 슬픔을 피해갈 수 없는 노년기를 아름다움으로 감싸 버린 그녀. 보석 같은 시를 쓰며 ‘멋짐’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녀.
우리 모두의 노년이 그러할 수 있다면 진실로 행복할 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