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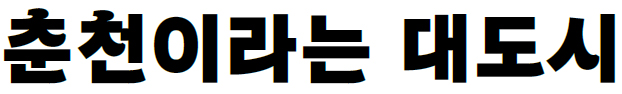
사십여 년 전의 이야기다. 내 나이 열 살 되던 봄, 우리 집은 화천에서 춘천으로 이사를 나왔다. 화천읍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비포장 도로로 사오십 분 덜컹거리며 달리면 도착하는 곳, 상서면 산양리가 내가 살던 곳이다.
이번 가을,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춘천에 놀러왔다. 친구들은 적절한 한가함과 인간에게 위압적이지 않은 규모를 지닌 작은 도시 춘천에 반했다. 대도시에 사는 이에게 춘천은 작은 도시지만, 열 살 먹은 나에게 춘천은 무척 큰 도시 그야말로 ‘대도시’였다.
산양리에 살 때는 개울과 산과 밭을 보면서 학교에 걸어갔다.
친구네 밭에 들러 보랏빛 가지를 하나 따서 손에 쥐고 야금야금 먹으면서 집에 걸어오기도 했다. 우리 집은 큰길에 접해 있었는데 대문을 열고 “정애야!” 큰길 건너에 사는 친구를 크게 부르면 정애가 내 목소리를 듣고 문 밖으로 나왔다. 이름은 ‘큰길’이지만 그렇게 작은 큰길이었다. 산양리는 내게 천진한 삶이 가능한 ‘작고 귀여운 세계’였다.
춘천에 와서 집에서 가까운 춘천 초등학교에 에 다니게 되었다. 개울이나 밭은커녕 좁은 골목으로 이어진 남의 집 담장을 보며 걸어 등교했다. 어린이의 눈에는 골목의 담장은 성벽처럼 높아만 보였다. 집 대문을 열고 나오면 차가 씽씽 달리는 큰길이어서 이름 부를 친구도 내 목소리를 듣고 곧장 뛰어나올 친구도 없었다.
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 없어 옹송그리며 학교에 다녔는데 도시 친구들이 “너 살던 곳에 사냥꾼도 있어?” 물었다. 나 들으라는 듯이 “쟤 사냥꾼처럼 생기지 않았니?” 했다. ‘산양’과 ‘사냥’의 발음이 비슷한 연유로 장난을 걸어온 것일 테지만 열 살 어린이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부적응 학생’이 되었다. 학교에 갔다가 내키는 때에 집에 왔다. 무단조퇴를 일삼는 학생이 된 거다. 집에 와서 혼자 놀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셨다. 선생님과 엄마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 내용은 잊었지만 선생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것만 기억하고 있다. 선생님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천천히 학교에 마음을 붙였다.

하루는 엄마와 집 근처를 지나다가 지상의 냄새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고소한 냄새가 내 코를 스쳤다. ‘프린스 제과’ 라는 빵집 앞이었다. 이 빵집은 현재 춘천에 없지만, 신성미소지움아파트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황금색에 가까운 통통한 자태의 식빵들이 빵 쟁반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산양리에는 제과점이라는 게 없었는데 갓 구워져 나온 식빵 냄새는 어린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냄새라기보다 향기였다. 엄마는 빵집 앞에서 걸음을 멈춘 나를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식빵을 하나 사줬다.
그후 한동안 일요일 오전마다 프린스 제과에 심부름을 다녀왔다. 금방 구워져 나온 식빵을 한 덩이 사오는 심부름이었다. 칼로 썰어지지 않을 만큼 따끈한 식빵 한 덩이 안고 집에 오는 짧은 길은 빈 틈 없이 꽉 찬 마음이었다. 우리 가족은 제각각 손으로 식빵 귀퉁이를 뜯었고, 나는 따끈한 식빵을 마요네즈에 찍어 먹기를 좋아했다. 식빵을 뜯어 먹는 동안만큼은 산양리를 덜 그리워했던 것 같다. 향수병의 ‘약’은 식빵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찰흙을 준비해 오라고 하셨다. 산양리에는 찰흙이 있는 산이 있었다. 학교에서 찰흙을 준비해 오라 하면, 우리는 비닐봉지를 들고 그 산에 가서 찰흙을 퍼왔다. 흙에 묻어온 돌을 골라내면서 찰흙을 주물러 뭘 만들었다. “춘천은 어디 가서 찰흙을 퍼와?” 짝꿍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더니, 짝이 “찰흙?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팔아.” 알려주었다. 내 마음은 대혼란에 휩싸였다. ‘찰흙이 문구점에 있다고? 정말?’
집에 오는 길에 당장 학교 앞 문구점에 들렀다. 문구점에 들어서니, 주인 아저씨가 어른 허리 정도 높이의 매대 안쪽에 서 있었고, 매대 위에 뭔가 있었다. 손바닥 크기의 납작하고 동그스름한 갈색 덩어리들이 비닐에 각각 포장된 채 벽돌처럼 층층이 쌓여있었다. 그것들이 다 찰흙이었다. 찰흙을 발견한 내 눈의 변화를 측정했더라면 어땠을까. 눈 크기가 확 커지고 동공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입이 좀 벌어졌을지도 모르겠다. 찰흙은 과연 문구점에 있었다. 찰흙을 문구점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산양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린이가 대도시 춘천에서 살게 되었다. 도시 친구들 앞에서 쭈뼛거리기 일쑤였고 산양리를 애타게 그리워했지만 춘천이 조금씩 곁을 주고 무엇을 내어주었다. 담임 선생님이 큰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프린스 제과의 따끈하고 향긋한 식빵이 산양리를 잊는 시간을 내어 주었다. 산양리의 어린이는 문구점에서 찰흙을 구입하는 대도시 춘천의 세계에, 춘천의 삶에 이제 막 진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