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에는 분명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 노래는 가볍게 그 일을 해내거든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색깔을 노래는 소리로 보여주지요. 노래를 함께 듣고, 부르는 경험은 소중하게 기억됩니다. 음악 전공도 아니면서 언제나 음악의 숲을 서성이는 이유예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얼렁뚱땅 배운 기타는 생각보다 삶의 곳곳에서 즐겁게 쓰였어요. 잠시 아련한 필터를 끼운 채 글을 읽어주시겠어요? 녹슨 철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면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반기는 동아리방, 거기서 우리는 목청껏 노래를 불렀고, 술을 마시고, 시대와 사랑을 토론했지요. 그 어렵다는 F코드를 잡다가 F학점을 받은 선배를 따라 동아리방 기타 앰프를 바꾸자고 새벽마다 인력사무소를 찾기도 했고요. 때가 되면 공연을 준비했고, 뚝딱이던 악기들 소리가 점차 조화를 이루다 보면 우리는 무대에서 박수와 환호를 받았어요. 그럼 어김없이 눈물이 났답니다. ‘한 사람의 노래는 만인의 가슴을 울리나니’ 그땐 이런 말들에 취해있었는데요. 내 젊음이 짙은 농도로 기억되는 것은 다 이 덕분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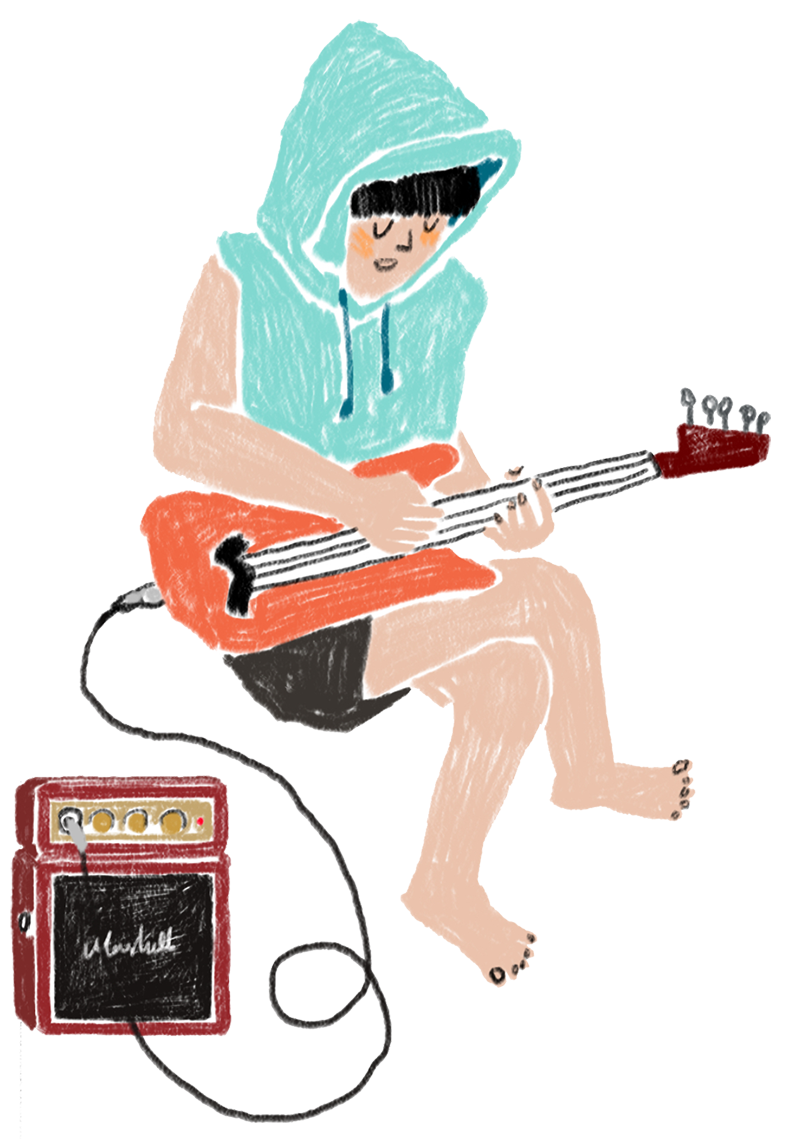
선생님이 되자마자 자연스럽게 학교에 밴드부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뭘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쑥쑥 자랐는데요. 이 녀석들은 지금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기도 하고, 인디 밴드에서 보컬로 활동하기도 하고 그래요. 누군가를 깊게 사랑하다 보면 뭐라도 더 해주고 싶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매년 노래를 선물해주기로 했어요. 기타 코드를 따라 흥얼거리다가 그럴싸한 멜로디가 나오면 이걸 노래로 만들었죠. 그렇게 10곡이 넘는 노래가 생겼어요. 매년 아이들과 함께 부르기도 하고, 졸업식 무대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래요.
직접 얼굴 보고 하기엔 좀 부끄러운 말들도 노랫말로 만들면 꽤나 감동을 주더라고요. 아이들의 글로 노랫말을 쓰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만든 노래에는 이런 마음을 담았어요.

‘알잖아 열아홉은 누구나 넘어지지,
그래도 열아홉은 누구든 일어서지’,
‘마치 겨울 같은 고3의 삶, 겨울에도 여름처럼 사람이 익지’,
‘우리는 무엇을 그린 걸까, 그림 속 아이는 행복할까’,
‘세상에 넘어져도 울지 말고 일어나 날아올라’
‘너는 머지않아 꽃이 될 테니까’,
아, 이 문장들은 읽지 말고 들어봐야 하는데.
교사에게 첫 학교는 첫사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3년을 함께 지낸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겹게 봐놓고도 여름방학에 못 보니까 조금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노래를 만들었죠.
‘맨날 공부나 하라고 잔소리해서 미안해. 한없이 투명한 너희들에게. 마주칠 때마다 항상 웃고, 매일 내게 기쁨을 주고, 쌤~! 하며 달려오는 너희가 좋아’
주책없는 고백 공격에 아이들은 풋, 웃고 말았어요. L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재미없는 내 개그에도 꺄르르 웃어주던 착한 학생이었죠. 이 아이들은 대학에 갔고, 청년이 되어 뚜벅뚜벅 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올해 10여 년 만에 다시 첫 학교로 발령받았답니다. 첫사랑의 추억이 가득한 그곳으로요. 그런데 L도 음악 선생님이 되어 모교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과 선생님에서 동료가 되어 다시 만난 거지요. 이제는 제가 L을 쌤~! 하고 부른답니다.

L이 또 마침 음악 선생님이어서 참 좋아요. 음악실을 눈치 안 보고 쓸 수도 있고, 밴드부 활동도 적극 지원해주시거든요.
“쌤! 우리 버스킹할까요?”
L은 그때처럼 꺄르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주었고, 마음 맞는 선생님들과 체육대회, 축제 때 버스킹을 열었어요. 아이들은 옛날처럼 즐거워했고, 학교는 그때 그 모습으로 여전히 다정했고, 나만 나이 먹은 것 같은데 그조차 잊은 채 행복했답니다. 특히 이제는 ‘너희가 좋아’를 L과 같이 부르거든요. 이런 노랫말을 중간에 더해서요.
‘나도 선생님이 됐지. 투명한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울고 웃고, 나도 너희가 좋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