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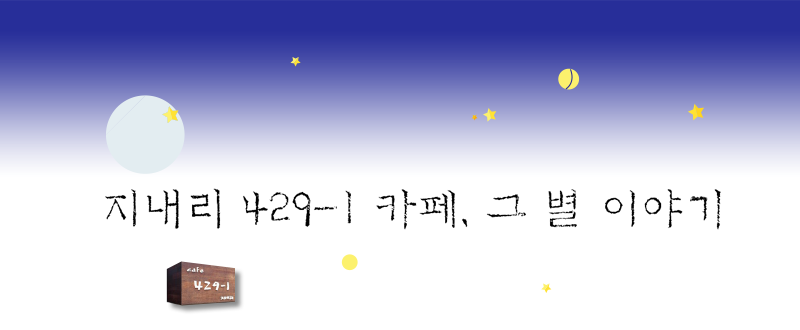
우리는 전혀 낯선 곳에서 익숙한 풍경에 놀라게 된다. 그리고 오래전 꿈을 떠올린다. 혹시 여기가 이전에 내가 꾸었던 꿈속의 그 장소는 아닐까.
그것을 사람들은 데자뷰, 또는 기시감이라 부른다.
하늘은 시리고 푸르렀다. 기러기 떼도 날지 않고, 오리 떼도 보이지 않는 창공이, 아스라이 위태롭게 펼쳐져 있는 날이다.
올 때는 분명 청회색의 구름이 덮여 있던 하늘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새파란 하늘이 나타났고 비단 같은 구름이 엷게 저쪽으로 펼쳐져 있었다.
해맑은 오후였다. 지내리에 들어서자 이상하게도 세상이 달리 보였다. 좁은 오솔길이 마을을 구불구불 가로질러 북으로 갔다.
군데군데 길옆에 세워진 ‘429-1카페’란 화살표 안내 팻말을 스쳐 지나갔다. 카페의 이름이 땅의 번지수라니.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이름이었다.
누가 그 번지를 금세 기억할 수 있단 말인가. 주인의 고집 센 얼굴이 떠올려졌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왔던 ‘소행성B612’를 연상했다. 수천억 개의 별 중에서 천문가에게 발견된 별은 너무나도 작다. 너무나도 멀고 멀어서 육안으론 볼 수 없는 희미하고 작은 별이기에 큰 별처럼 북극성이나 시리우스 같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고배율의 천체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는 별에게 천문가들은 일련번호를 매긴다.
하지만 이런 암호 같은 별은 신비감을 더욱 자아내는 법이다. 생텍쥐페리가 그랬다.
불멸의 동화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별 ‘소행성B612’엔 매일 청소하는 분화구 하나, 바오밥나무 한 그루, 의자 한 개, 장미 한 송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우린 희미한 존재의 빛과 별을 상상하고 그 상상에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정말 의자 하나가 정원 입구 한가운데 놓여 있다. 마흔세 번 해지는 풍경을 바라보던 그 의자가 맞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직사각형의 카페 건물은 이제 막 착륙한 네모난 우주선 같다. 나는 광속 200만 년 전 저쪽 429-1의 별을 떠올린다.
삼면이 유리창으로 된 실내 한가운데 뿔이 긴 치우천 왕이 눈에 띈다.
나는 그 옆 탁자에 앉는다. 유리창 사이사이 기둥마다 조각품과 그림들이 놓여 있다.
그 은은하고 깊음이 전체 실내를 고요의 빛으로 감돌게 한다.

손님 두 분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강물처럼 흐른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다. 우주 저쪽의 방언이라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주인은 콧수염을 길렀다. 42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 아내와 만나 결혼할 때도 콧수염은 주인의 트레이드마크였다. 주인의 이름인 박명환보다 검은 반창고를 붙인 듯한 콧수염이 주인을 더욱 주인답게 한다. 물론 연기할 때도 콧수염은 늘 그대로이다.
주인 박명환, 아니 콧수염은 지금도 현역 연극배우로 활동 중이다. 주로 단역이나 조연을 많이 연기한다. 예전엔 주연도 맡긴 했지만, 조연에 특화된 배우이다.
이 429-1카페의 실질적 주인은 사실 그의 아내이다. 또 한 사람, 옥수수 과자나 카스텔라, 비스킷 등을 만들어 묵묵히 내미는 이는 박명환의 바로 밑 동생이다. 그러니까 세 사람 모두 이 카페의 주인인 셈이다. 예순일곱의 이 노배우는 한가할 때는 창가에 앉아 대본을 읽는다.

“소나무 위의 기러기”
그는 이 카페에서 일인극을 준비하고 있다. ‘429-1카페’는 아늑한 휴식처이지만 예술의 향내가 은은히 풍기는 곳이다.
이른 봄이 되면 기러기가 북으로 날아갈 테고, 별카페 429-1에선 노배우의 낭랑한 목소리와 몸짓이 펼쳐질 터이다. 그는 북으로 날아가다 잠시 카페에 들른 기러 기가 될 것이다.
우린 듣는다.
먼 나라 이야기를.
우린 상상한다.
신비한 우주의 별 지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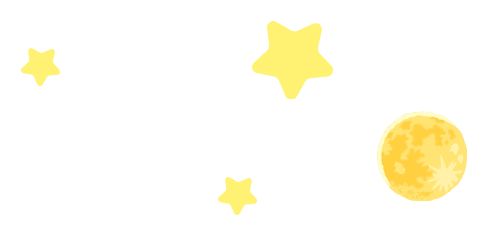
429-1 카페에서 야트막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시를 쓰는 시인이 산다. 그는 반장 일을 하다 지금은 내놓았지 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시인반장이라 부른다. 박명환 배우는 그곳에서 시인과 더불어 먼 산과 하늘을 본 뒤 별마제 마을로 간다.
그 마을에 희곡을 쓰면서 연출을 하는 장정훈이란 분이 있다. 신북문화예술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마을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짬짬이 연극 연습을 한다.
그들을 지도하는 이가 바로 박명환 배우다.
해마다 이 연극은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소박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내는 이 연극은, 마을을 더욱 윤택하고 활력 있게 만든다.

어느 날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이 외진 429-1카페를 찾았다.
그들은 신발을 벗고 맨발이 되었다. 그리고 카페 앞의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물론 박명환 배우가 앞장섰다.
두 시간 후 맨발의 사람들은 카페로 들어섰다. 숲에서 숨을 쉬고, 맨발로 땅을 밟은 그들은 맑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후 이들은 틈날 때마다 맨발로 숲을 걷는 사람들이 되었다.
문득, 한 사람이 들어섰다.
바로 이웃한 도예가 김윤선 님이다.
그는 김유정 마을 금병산 기슭에서 흙을 빚으며 살았다. 어느 날 도예가는 새가 되어 우연히 이곳을 날아들게 되었다.
꿈에 본 장소가 이곳일까, 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도예 가는 콧수염 주인을 만났다.
그리고 즉시 429-1카페 바로 옆에다 땅금을 그었다. 뚝딱, 뚝딱, 뚝딱. 작업실이 금세 지어졌다.
일곱 대의 이삿짐 차가 들락거렸다.
산더미 같은 도예작품들이 작업실 안에 놓이기 시작했다. 정리 정돈이 되려면 언제쯤일까.
백자달항아리, 철화항아리, 꽃병, 새, 푸른 접시 등이 진열된 중에서 나는 한 채의 집을 발견했다. 개똥철학관이었다. 어린 시절의 허름한 집에 걸린 간판, 전봇대, 가로등, 버스정류장이 나를 거기 서게 했다.
여기 도예작품들은 원석 같은 느낌이 났다. 아니 별똥별이라 해야 하나? 거친 질감이 다른 도예작품과는 사뭇 다르게 보였다.

- 정리되면 마당에다 도예작품을 수시로 전시할 겁니다.
그리고 김윤선 도예가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박명환 배우도 하늘을 쳐다보았다.
아직 기러기 떼는 오지 않았다.
바람이 먼저와 기러기가 언제 올지 알려주었다.
기러기가 지나가는 날, 분명 그중 한 마리가 429-1카페에 빛처럼 남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