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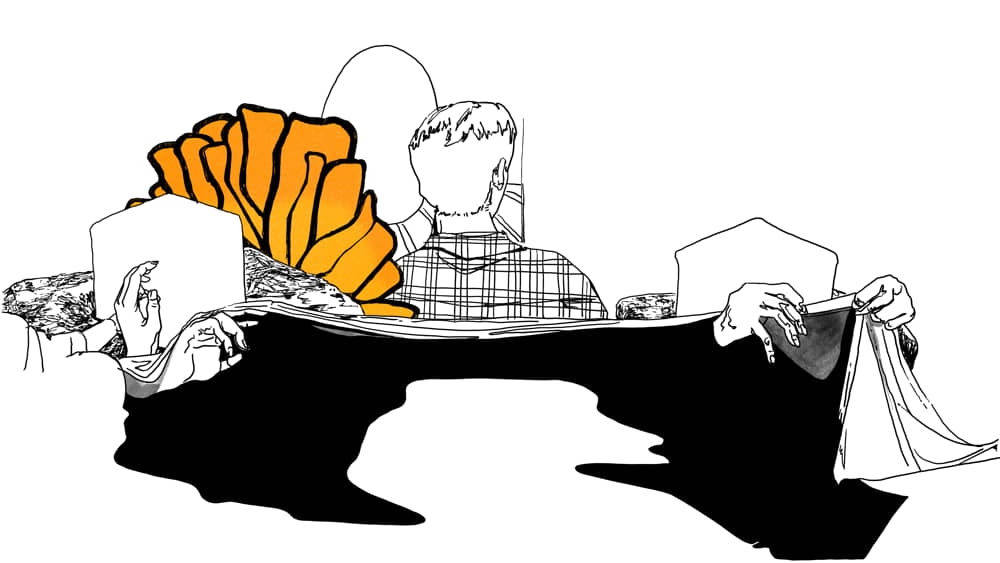
뜨거운 햇빛 아래 걷다 지친 몸을 거실 바닥에 뉘입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땀이 식으며 정신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다 창문너머로 낮고 점점 푸른색이 짙어지는 하늘이 눈에 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이곳에 살다보면 계절이 바뀌는 감각을 누구나 하나 이상씩은 가지게 되죠. 수많은 감각들 가운데 저는 하늘의 색과 깊이를 보며 변해가는 계절을 느끼는 편입니다. 건물들의 높이가 그리 높지 않은 덕분에 굳이 고개를 들지 않아도 어디서나 하늘이 잘 보이는 이곳에 살며 생긴 감각입니다.
약 10년 전 캠프페이지는 지금과 달리 구조물이 하나도 없는 너른 들판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채운 것은 낮게 뻗은 벽돌 건물 몇 채와 잔뜩 자란 풀들 사이로 아슬하게 우뚝 솟은 저수탑 뿐이었죠. 그 바로 옆에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탁 트인 풍경을 학교에서 바라보면 시야의 대부분은 하늘로 가득 찼죠.
야간자율학습을 하기 위해 학교에 남아 있었던 것을 떠올려보면,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러다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평소와 달리 오묘한 빛으로 물든 창 밖 풍경이 눈에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붉고 은은하게 노란끼가 맴도는 주황빛 노을과 오후에 잠시 내렸던 소나기가 만들어낸 보랏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푸른 어둠이 차분히 내려앉고 있었죠. 온 하늘에 어슴푸레 어둠이 깔릴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지내고서야 그날 본 하늘이 춘천의 여름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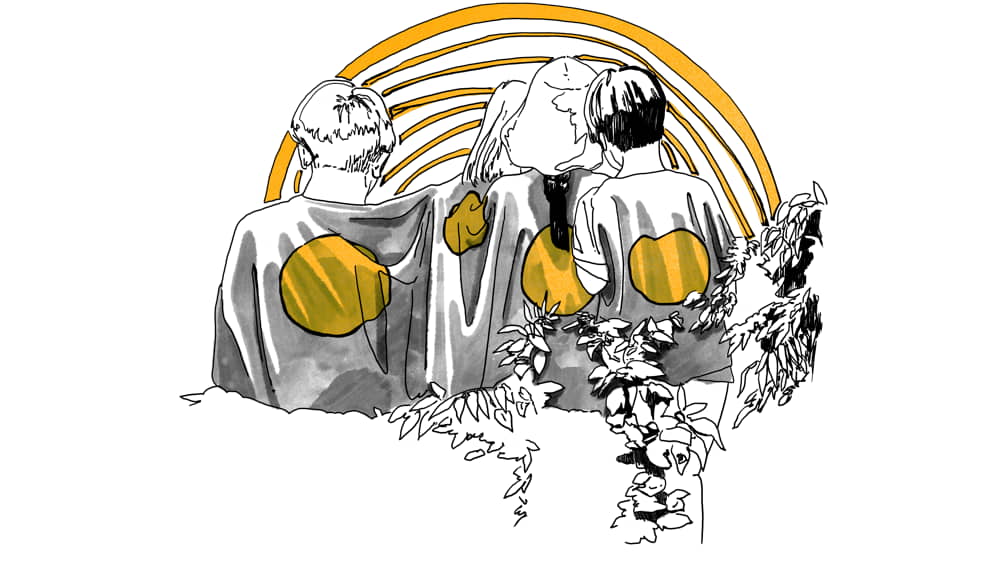
그때부터 제게는 하늘을 올려다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채도가 높아 쨍한 하늘, 반대로 채도가 낮아져 무겁고 차가운 하늘, 약간은 가벼워져 한없이 멀리 날아가는 듯한 하늘, 핫핑크와 보라, 회색이 한 화면에 뒤섞인 여름 하늘, 거의 채도가 없다시피 하지만 차가움이 느껴지는 회색빛 겨울 하늘. 노을이 특히 금빛으로 반짝이던 가을 하늘.
몇년간 꾸준히 만나온 춘천의 하늘은 매년 다른 것 같지만, 그 계절에만 보이는 색과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시간이 꾸준히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지표가 되어주었죠.
며칠 전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 단지를 보며 동생이 “아. 여기서 신호를 기다리며 바라보던 하늘이 가장 예뻤는데.” 라며 읊조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의 흐름을 느꼈듯, 동생도 그를 바라보며 분명 무언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이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 지금은 높은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을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점점 줄어 아쉬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감상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한 오래도록 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다양한 색들이 짙어질수록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이 계절은 점점 무르익어갈 것입니다.
그와 함께할 20대의 마지막 여름을 무사히 보낼 즈음에는 저 역시 무르익어 조금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있길 기대해봅니다.
김수영
회화작가. 10여 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아온 탓에 표준어와 사투리가 섞인 억양을 쓰지만, 어엿한 15년차 춘천인.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만들어내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들을 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