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은 15개의 동과, 10개의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내를 둘러싼 10개의 읍·면은 춘천 면적의 95%를 차지한다. 그만큼 넓기 때문에 읍·면에 사는 사람들에게 마을버스의 의미는 시내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다. 중요한 또는 유일한 교통수단인데다가, 버스 기사는 함께 시내에 나가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벗이다. 지난 4월, 춘천의 대중교통 활성화 분야에 공(公)을 세워 포상을 받은 장춘근 기사와 강길성 기사의 마을버스에 올라타 그들의 일상을 따라가 보았다.


장춘근 기사는 동내면으로 들어가는 마을버스를 운전한 지 4년째다. 승객들이 어디서 타고 어떤 이유로 시내에 나오는지 꿰뚫고 있다. 특히 버스의 ‘안전’과 ‘청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만의 이유가 있다. 그의 어머니는 집 앞에서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50대였고 그는 20대였다. 갑자기 찾아온 슬픔에 다짐했다.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속도보단 안전을 위해 운전하겠노라고.
장 기사는 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어느 날 업무차 한국은행에 갔다가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얼굴이 비쳤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청소를 이렇게 열심히 할 수도 있구나’ 생각했다. 그때의 기억이 특별해, 버스 기사가 된 후로 하루에 네 번 버스 바닥과 계단을 닦는다. 얼굴이 비치진 않겠지만 먼지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다.



<동내4번 마을버스를 타고 바라본 사암리 풍경 >

5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20분, 중앙시장에서 출발하는 동내 4번 버스에 첫 승객이 타자 장춘근 기사가 안부를 물었다. “누님, 어디 갔다 오셔?” “오늘은 약속 있었어” 매일 나누는 대화처럼 서로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다. 몇 정거장을 지나자, 이번엔 승객이 기사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 “기사님, 삶은 계란 2개 있는데 잡술 거야?” “주시면 감사히 먹죠” 일터로 향하는 승객에게는 계란을 받았고, 80대 ‘떡순이 할머니’(떡을 좋아해서 시장에 떡 사 먹으러 나오는 별명이 떡순이 할머니인 승객)에게는 떡을 받았다. 장 기사는 지난겨울 대룡산 종점에 정차하고 개울 옆을 지나다가 발이 얼음물에 빠진 적이 있다. 언 줄 모르고 발을 헛디딘 것이다. 이때 멀리서 지켜보던 단골 승객이 집에서 양말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평소 그가 쌓아 올린 신뢰와 친절이 승객에게 전달됐고 다정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장 기사의 진심이 닿은 곳엔 기분 좋은 승객과 안전한 버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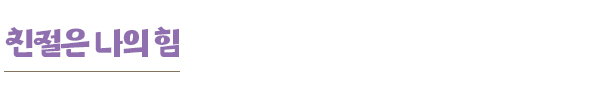
“참 친절하시네요” “상 줘야 해” 하차하는 승객들이 한마디씩 하고 내린다. 장춘근 기사는 칭찬을 들을 때면 멋쩍게 웃어 버리지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는 엄격하다. 버스가 정차 중 자리에서 일어나면 앉으시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승객을 내려줄 땐 버스를 인도에 바짝 댄다. 천천히 내릴 수 있게, 편하게 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 버스 시간이 헷갈리는 마을 분들을 위해서는 큼직한 시간표를 만들어 마을회관 입구에 붙여놨다. 이렇게 세심한 배려와 친절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버스를 운행해야 하므로 장 기사가 종점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5분이다. 그마저도 버스를 청소하며 보낸다. 지칠 법도 하지만 장 기사는 기분 좋게 버스에 탈 승객을 생각하며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달린다.


5월 4일 목요일, 중앙시장에서 오전 10시 25분 출발하는 신동 2번 마을버스에 몸을 실었다. 신동 2번 마을버스를 모는 강길성 기사는 자상하고 배려심 많기로 알려져 있었다. 퇴계동에서 승객이 올라타자 강 기사가 안부를 묻는다. “요즘도 나무 심어요?” “나무는 다 심고 지금은 고구마 심어요” 이윽고 금병초 앞에서는 배낭을 멘 어르신이 너덧 명이 뛰어와 버스에 올랐다. 이번에도 강 기사가 인사를 건넸다. “벌써 끝났어요?” “아유, 하마터면 못 탈 뻔했네. 끝났어, 끝났어” 승객들과 원래 아는 사이여서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건지 물어봤다. “아니에요. 앞에 타신 분은 여기 아파트 사는데 밭에 일하러 남편분과 다니시고요. 뒤에 타신 분은 팔미리 사는데 쓰레기 정화 활동하러 가끔 나오세요” 강 기사에게 승객은 단순히 버스를 이용하는 손님이 아닌, 일상을 공유하는 이웃이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승객을 향한 그의 다정한 배려가 느껴져 덩달아 마음이 편안해졌다.

강길성 기사의 고향은 부산이다. 어릴 적 이소룡에게 반해 중국 무술인 쿵후를 배우기 시작했고 운동이 재밌어서 안 해 본 운동이 없을 정도다. 1995년에는 자전거를 타고 지리산에 올라가기도 했다. 당시 매표소 직원도, 절의 스님도 자전거 타고 지리산을 오르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신기해했을 정도다. 강 기사의 산사랑은 춘천에서도 계속됐다. 춘천을 둘러싼 모든 산에 올랐다. 한번은 방아산 밑에 쓰레기가 자꾸 쌓이는 걸 보고 시에 민원을 넣어 깨끗하게 치우기도 했다.
춘천에 온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2002년 부산에서 춘천으로 이사 왔고 볼링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춘천이 제2의 고향이 됐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새로운 일을 찾았는데, 좋아했던 운전을 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단다. 그렇게 대형 버스를 운전하기 시작했고 마을버스를 몰게 된 지는 3년째다.



<신동2번 마을버스를 타고 바라본 증리, 혈동리 풍경>

산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봄이 되면, 승객들의 짐이 많아진다. 강길성 기사는 양손 무겁게 나물 바구니를 든 어르신을 보면 부모님 생각에 스스럼없이 말을 걸고 짐도 들어드린다. 강 기사가 예쁜 어르신들은 각종 봄나물로 고마움을 전한다. 좋아서 하는 일인데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는 멋쩍게 웃었다.
“제가 옛날 것들을 좋아해요. 시골길에서 생명이 싹트는 자연을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안 좋을 땐 시장에 가요. 부모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다양한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져요.”
마을버스를 운행하며 눈에 담기는 정다운 풍경에 강 기사의 기분이 좋아지고, 이는 승객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자리에 앉을 때까지, 버스에서 완전히 내릴 때까지 강 기사의 시선은 승객에게 머문다. 우리 동네에 내 안부를 묻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주는 버스 기사가 있다는 사실에 삶이 든든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