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때의 좋은 기억을 꼽아보자면 꼭 한번씩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미술실 건물 앞에는 꽤나 큼지막한 나무가 있었죠. 이맘때면 촘촘히 자란 가지들 사이로 벚꽃이 만개하였습니다. 한창 시험공부에 지쳐 있던 4월, 쉬는 시간이면 우린 틈틈이 나무 밑으로 모였죠. 교실 친구들부터 동아리 선후배 다같이 모여 사진을 찍으며 놀았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그 앞에 앉아 약간 온기가 실린 저녁 바람을 맞으며 저 멀리 공차는 모습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여기에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아 어슴푸레한 하늘에 마음은 덩달아 들떴습니다.

열 여덟, 봄의 기억입니다.
며칠 전 명동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문뜩 오랜 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때처럼 따뜻하게 불어온 바람 때문이었겠죠. 그대로 큰길을 건너 골목을 따라 춘천역 방향으로 5분정도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낯익은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쉽게도 교정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교문 앞에서도 빼꼼히 삐져나온 나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통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정말 그 한 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이지 않고, 딱 거기 멈춰 있죠.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또 한번 반복한대도 그때와 같을 확 률은 거의 없습니다. 멈춰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을 우리는 영원히 간직하며 기억합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는 소재죠. 옷장 안에 들 어가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쥐면 원하는 순간으로 되돌 아갈 수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 자신과의 기억을 지워 버린 연인에게 화가 나서 똑같이 기억을 지우러 병원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꽃과 풀이 무성한 어느 찻 집의 마들렌을 베어 물면 그리워하던 어린 시절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하지요.

그날의 기억도 떠올려보면, 정작 예쁘게 꽃이 피어 있던 기간은 2주가 조금 덜 되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게으름을 피워 자칫 시기를 놓치면, 금방 꽃잎을 떨구고는 연한 녹색 잎을 올려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수많은 학창시절의 기억 가운데, 특히나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고, 언젠가는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것들에 끌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아름답고, 특별하다고 느끼며 강렬했던 기억으로 남겨두곤 하죠. 내 눈 앞의 것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순간에 조금 더 충실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그 유한함 덕분에 당시에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지 기도 하죠. 그리고 이를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곱씹으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곤 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2012년의 봄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저처럼 말이죠.
오늘도 십여 년 전의 기억을 되뇌며 얼마 남지 않았을 그날을 기다립니다. 스물 아홉의 봄도 그 순간에 충실할 수 있길, 특별히 아름다웠다고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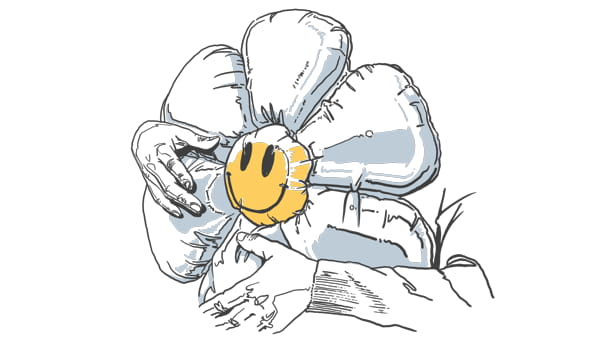
김수영
회화작가. 10여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아온 탓에 표준어와 사투리가 섞인 억양을 쓰지만, 어엿한 15년차 춘천인.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만들어내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들을 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