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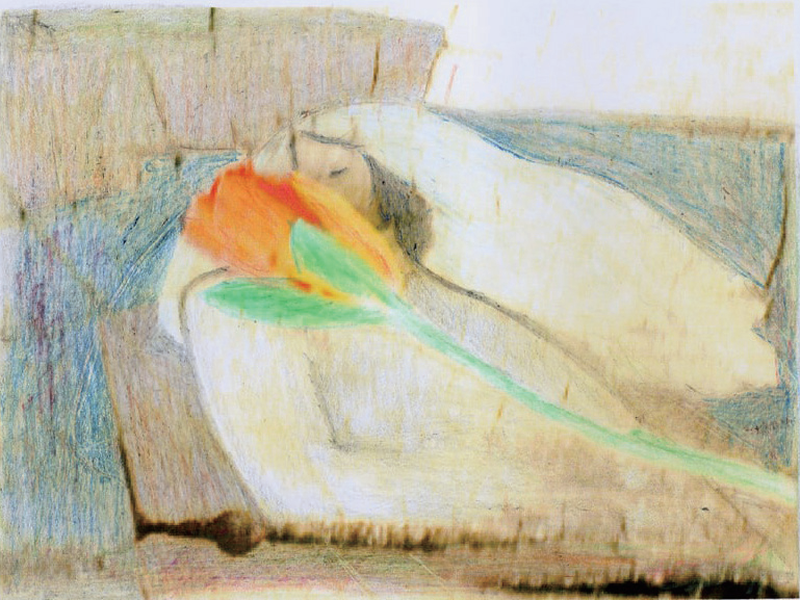
<우리는 인간의 이름으로 너를 안는다> 종이 위에 수채화 물감 · 색연필, 정상명
나는 지난 호, 녹색 이야기(10)에 “대멸종을 피할 재간이 없다”면서, “개인의 작은 실천이야 숭고한 일이지만 국가가 존속하는 한, ‘동시대적 견해’의 일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그런 단언이 나를 한 달 내내 불편하게 했다. 그것은 개인과 국가공동체의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에 대한 극단의 회의적 시각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만 해도 코스타리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군대 없는 나라’로 만 알고 있던 코스타리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기자 내 단언이 부끄러워졌다.
중미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코스타리카는 흔한 말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구매력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은 2016년 1인당 1만6,100달러로 세계 102위 정도다. 지금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돈’이 신神으로 추앙받고 있는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코스타리카는 후진국이고 별 볼 일 없는 나라다. 그런데 이 나라는 1990년대부터 산업활동에 환경파괴의 비용을 매기는 경제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우리가 신주처럼 떠받치는 국내총생산을 끌어올리려 하지 않고, 환경파괴가 불러올 사회적 비용까지 계산해서 경제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코스타리카는 바나나 커피 사탕수수 등을 수출하는 전형적인 열대 농업국가였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칩 산업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나라 성장 전략의 특징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속 가능성’이다. 코스타리카의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개인 소유의 땅도 제멋대로 이윤 창출로 사용할 수 없다. 땅 주인이 숲을 보호하고 강물을 깨끗이 보존 하면 정부가 보상한다. 근처의 아마존이나 보르네오의 숲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 매일같이 엄청난 벌목이 일어나서 대기의 산소량을 줄이고 있지만, 코스타리카는 2005년부터 ‘숲을 잃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코스타리카에는 환경행정법원의 전문가들이 나라의 환경을 망치는 ‘악당들’을 잡아내서 엄벌한다. 1997년부터 이 나라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무거운 탄소세를 매겼다. 그렇게 거둬들인 돈은 환경파괴의 희생양이 되기 쉬운 빈민들을 위해 사용한다.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흥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부서는 경제·산업 담당 부서가 아니라 환경부다. 환경부가 에너지·광업·수자원 등과 같은 행정을 총괄한다. 2004년에는 동부 해안에 유전이 있는 줄 알면서도 채굴을 금지시켰다. 그대신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95%를 재생에너지에서 얻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세계 1위다. “2021년까지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국이 되겠다”고 공언했는데, 결과는 고무적이다. 지구 전체 땅의 0.25%에 불과한 코스타리카에 세계 생물종의 6%가 살고 있다. 면적 대비 자연보호구 역의 비중은 세계 1위다.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San Jose) 옆 작은 도시에서는 꿀벌, 식물, 나비가 인간과 같은 시민으로 인정받고 보호받는다. 인간에게만 해당되던 법률 적 ‘권리’ 개념을 비인간非人間에게도 적용해서 인간만의 삶 터가 곧 생명의 낙원이 되었다.
개발과 환경의 공존을 추구하는 코스타리카의 재산은 생물다양성이고, 그것을 보고 배우러 오는 친환경 관광이다. 공해로 약자들이 죽어 가고, 이미 충분히 배부른 이들이 더욱 배를 채우는 양극화의 심화와 산천 파괴는 상상할 수 없다. 가히 ‘꿈의 나라’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한 칼럼니 스트는 코스타리카를 ‘21세기형 경제성장 모델’이라고 꼽은 적(2009년)도 있다. 흔히들 코스타리카의 성공적인 경 제모델만 이야기하지만, 나는 코스타리카에서 인류의 희망 을 본다. 어떤 나라가 선진국일까? 코스타리카의 실험이 인류세의 다른 나라들에게 지금 묻고 있다.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미국 남부의 플로리다는 세계적인 관광지이며, 미국에서 빈부차가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로 꼽힌다. 다르 자마일이라는 프리랜서가 온 세상의 기후변화 현장을 샅샅이 돌아다닌 뒤에 쓴 『지구를 위한 비가』(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년)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다. 플로리다는 가속되는 해수면 상승으로 확실하게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중이건만, 거기 정치가들이나 건축 업자들은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대목이었다. 특히 공화당 소속의 플로리다 주지사 릭 스콧이라는 인물은 대표적인 ‘기후붕괴 부정론자’인데,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기후변화’라는 말을 공적으로 입에 올리거나 공문서에 쓰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마이애미 헤럴드>, 2015년 3월 11일자)는 것이었다.
사실, 플로리다 주지사의 말은 새삼스러운 발언은 아니다.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환경보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리우국제회의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41대)이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양식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말보다 더 냉소적이고, 오만하고, 솔직하고, 무책임 하면서 허무주의적인 말을 나는 알지 못한다. ‘웃기지 마, 니네들이 백날 모여서 아무리 헛소리를 해댄다고 해도, 우리 미국인이 지금껏 살아 오던 생활방식은 바꾸지 않을 거야, 알겠니?’
우리나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을 물려주신 내 어머니의 나라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 코스타리카에 가까울까, 조지 부시나 플로리다 주지사에 가까울까?
* 이 글의 코스타리카 부분은 구정은의 『사라진, 버려진, 남겨진』(후마니타 스, 2018년, 213~216쪽)을 참조했음.

최성각
새나 돌멩이 등 비인간에게 참회를 표하는 방식으로 환경운동을 한 생태주의 작가.
‘삼보일배’나 ‘생명평화’ 같은 개념을 창출했다. 요산문학상, 교보 환경문화상을 받았다.
최근에 『산들바람 산들 분다』,『나무가 있던 하늘』을 펴냈다.